◇문화의 수수께끼를 풀다/찰스 킹 지음·문희경 옮김/560쪽·2만8000원·교양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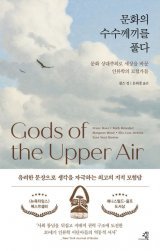
1925년 8월 대학원을 마친 갓 스물셋의 미국인 여성이 태평양 사모아 제도 투투일라섬에 홀로 내렸다. 이후 그녀는 10년 넘게 사모아인들과 살면서 사춘기 소녀들을 집중 관찰했다. 함께 밥을 먹고, 고기를 잡으면서 이들과 주변 사람들을 연구했다. 그 결과 그가 내린 결론은 반항적인 사춘기 현상은 서구적 개념으로, 호르몬 등 생리학적 변화와는 무관하다는 것. 그보다는 서구보다 평균 수명이 짧은 사회에서 10대부터 성인의 삶을 요구하는 문화에 따른 영향이라고 봤다. 인종이나 성별보다 후천적 문화와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화인류학자 마거릿 미드(1901∼1978)의 이야기다.
이 책은 미국 국제정치학자가 20세기 전반까지 서구 사회를 지배한 과학적 인종주의와 사회 진화론에 맞서 문화 상대주의를 꽃피운 문화인류학자 다섯 명의 삶을 추적한 것이다. 참여관찰법 등 문화인류학의 연구 방법론이 정치학 등 여러 사회과학에 적용되고 있는 걸 감안하면 국제정치학자가 저자인 게 이상할 것은 없다.
책은 문화인류학을 창시한 프란츠 보아스(1858∼1942)를 중심으로 그에게 배운 여성 제자들을 조명한다. 이 중에는 ‘국화와 칼’을 쓴 루스 베네딕트, 성역할은 자연적인 게 아니라 문화적 창조물임을 밝힌 마거릿 미드, 북미 원주민 출신으로 동족의 문화를 연구한 엘라 캐러델로리아, 미국 남부와 아이티에서 현지 연구를 토대로 소설을 쓴 흑인 페미니스트 조라 닐 허스턴이 포함됐다. 여성, 유색 인종, 성소수자의 타이틀을 하나 이상 가진 이들은 미국 주류사회에서 이단아 취급을 받았다. 피부색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문화들 사이에는 우열이 없다는 문화 상대주의를 이들이 주장한 건 우연이 아니었다. 스승인 보아스도 남성이었지만 독일에서 이주한 유대인 출신으로 이민자의 비애를 겪었다.
책의 향기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구독
-

Tech&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의 향기/밑줄 긋기]다정한 사람이 이긴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9/05/132330632.4.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