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몰려드는 참다랑어, 어획량 늘리려면[김창일의 갯마을 탐구]〈132〉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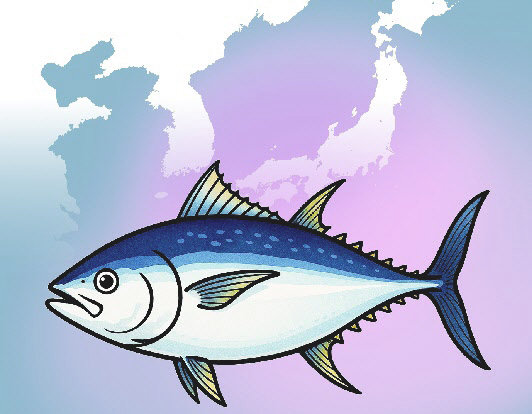

이달 8일에는 경북 영덕군에서 태평양참다랑어 1300마리가 잡혔다. 큰 개체는 길이가 1.5m, 무게는 150kg에 달했다. 9일에는 주로 열대 바다에서 서식하는 대왕쥐가오리가 제주 바다에서 붙잡혔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여파가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이다. 10일에는 강원 삼척시 정라진 앞바다에서 길이 3m, 무게 226kg의 황새치와 200kg에 이르는 참다랑어 6마리가 잡혔다. 12일에도 삼척 앞바다에서 대형 황새치가 포획됐다.
영덕군에서 잡힌 태평양참다랑어 1300마리는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없었다. 경북의 올해 참다랑어 할당량은 110t으로, 이미 할당량을 채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결국 폐기물 업체를 거쳐 가축 사료로 팔렸다고 한다. 2022년 7월에도 다랑어 수천 마리가 영덕 해변을 뒤덮은 적이 있다. 그해에 영덕 앞바다에 1만3000여 마리가 버려진 것으로 추정됐다. 쿼터 한도가 찬 상황에서 팔 수 없으니 버린 것이다.
일본의 할당량은 압도적으로 높다. 일본에 할당된 올해 태평양참다랑어 어획량은 1만2828t이다. 반면 한국의 할당량은 일본의 9.5% 수준이다. 할당량 결정의 중요한 기준은 ‘역사적 어획 실적’이다. 과거 어획량이 많았던 국가가 더 많이 받는다. 이어 해당 어종이 국가의 음식문화와 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따지는 ‘경제사회적 의존도’에 따라 산정한다. ‘과학적 관리·감시 능력’도 중요한 기준이다. 자원 보호와 쿼터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과 인력 수준을 평가한다. 이 외에도 서식지와 해당 국가 간의 거리, 외교적인 협상력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과거 참다랑어 어획 실적이 적었고, 주요 서식지와도 멀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동해에서도 100kg이 넘는 참다랑어가 다량으로 잡히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동해 일대에 참다랑어 산란지가 형성돼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은 참다랑어 주요 소비국이며 과학적 관리·감시 능력도 높은 수준이다. 참다랑어 증가량을 면밀히 조사해 WCPFC 총회 때 쿼터 할당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
김창일의 갯마을 탐구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알쓸톡
구독
-

컬처연구소
구독
-

특파원 칼럼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이준석, 장동혁 단식에 남미출장서 조기귀국…‘쌍특검 연대’ 지속
-
2
‘건강 지킴이’ 당근, 효능 높이는 섭취법[정세연의 음식처방]
-
3
反美동맹국 어려움 방관하는 푸틴…“종이 호랑이” 비판 나와
-
4
[단독]“여사님 약속한 비례 유효한지”…윤영호, 해임 뒤에도 건진에 청탁
-
5
멀어졌던 정청래-박찬대, 5달만에 왜 ‘심야 어깨동무’를 했나
-
6
송언석 “장동혁 단식 중단해야”…정청래 “단식 말고 석고대죄를”
-
7
李, 우상호 이어 이번에도 정무수석에 ‘비명계’ 홍익표 선택
-
8
김경 “강선우 측 ‘한장’ 언급…1000만원 짐작하자 1억 요구”
-
9
‘단식’ 장동혁 “자유 법치 지키겠다”…“소금 섭취 어려운 상태”
-
10
‘검정고무신’ 성우 선은혜, 40세에 세상 떠나…동료·팬 추모
-
1
北침투 무인기 만들고 날린 건 ‘尹대통령실 출신들’이었다
-
2
단식 5일째 장동혁 “한계가 오고 있다…힘 보태달라”
-
3
김병기 “재심 신청않고 당 떠나겠다…동료에 짐 될수 없어”
-
4
파운드리 짓고 있는데…美 “메모리 공장도 지어라” 삼성-SK 압박
-
5
‘단식’ 장동혁 “자유 법치 지키겠다”…“소금 섭취 어려운 상태”
-
6
송언석 “장동혁 단식 중단해야”…정청래 “단식 말고 석고대죄를”
-
7
조국 “검찰총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5급 비서관 두나”
-
8
“금융거래 자료조차 안냈다”…이혜훈 청문회 시작도 못하고 파행
-
9
한병도 “국힘, 조폭이 이탈한 조직원 보복하듯 이혜훈 공격”
-
10
단식 장동혁 “장미보다 먼저 쓰러지면 안돼”…김재원 ‘동조 단식’ 돌입
트렌드뉴스
-
1
이준석, 장동혁 단식에 남미출장서 조기귀국…‘쌍특검 연대’ 지속
-
2
‘건강 지킴이’ 당근, 효능 높이는 섭취법[정세연의 음식처방]
-
3
反美동맹국 어려움 방관하는 푸틴…“종이 호랑이” 비판 나와
-
4
[단독]“여사님 약속한 비례 유효한지”…윤영호, 해임 뒤에도 건진에 청탁
-
5
멀어졌던 정청래-박찬대, 5달만에 왜 ‘심야 어깨동무’를 했나
-
6
송언석 “장동혁 단식 중단해야”…정청래 “단식 말고 석고대죄를”
-
7
李, 우상호 이어 이번에도 정무수석에 ‘비명계’ 홍익표 선택
-
8
김경 “강선우 측 ‘한장’ 언급…1000만원 짐작하자 1억 요구”
-
9
‘단식’ 장동혁 “자유 법치 지키겠다”…“소금 섭취 어려운 상태”
-
10
‘검정고무신’ 성우 선은혜, 40세에 세상 떠나…동료·팬 추모
-
1
北침투 무인기 만들고 날린 건 ‘尹대통령실 출신들’이었다
-
2
단식 5일째 장동혁 “한계가 오고 있다…힘 보태달라”
-
3
김병기 “재심 신청않고 당 떠나겠다…동료에 짐 될수 없어”
-
4
파운드리 짓고 있는데…美 “메모리 공장도 지어라” 삼성-SK 압박
-
5
‘단식’ 장동혁 “자유 법치 지키겠다”…“소금 섭취 어려운 상태”
-
6
송언석 “장동혁 단식 중단해야”…정청래 “단식 말고 석고대죄를”
-
7
조국 “검찰총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5급 비서관 두나”
-
8
“금융거래 자료조차 안냈다”…이혜훈 청문회 시작도 못하고 파행
-
9
한병도 “국힘, 조폭이 이탈한 조직원 보복하듯 이혜훈 공격”
-
10
단식 장동혁 “장미보다 먼저 쓰러지면 안돼”…김재원 ‘동조 단식’ 돌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참다랑어 많이 잡아도 유통 못 하는 현실[김창일의 갯마을 탐구]〈133〉](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8/05/132135602.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