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 사진 속 시민과 자율주행 로봇이 찍은 거리의 시민 얼굴 [청계천 옆 사진관]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백년사진 No. 130
● 100년 전 가을 풍경 사진 몇 장…이번 주 ‘백년사진’은 100년 전 신문 지면에 실린 가을 풍경 사진 다섯 장을 골랐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카메라도, 이동 수단도, 인쇄의 수고로움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던 시절에 정성껏 찍고, 엄선해 지면에 실은 사진들이라 더 소중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의 석양 풍경입니다.


네 번째 사진(아래)은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풀을 뜯는 말과 뒤편 양옥집을 보여주면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은 장대비 속 우산을 쓴 사람들이 젖은 도로 위를 걷는 풍경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장의 풍경 사진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있어도 풍경 속의 작은 점처럼 스쳐 지나가듯 담겼습니다. 오늘날 신문 사진이나 작가들의 풍경 사진이 사람을 풍경의 일부로 반드시 포함하려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풍경 사진에 얼굴은 언제부터 들어왔을까
사진기자인 제 눈에는, 100년 전 풍경사진은 자연 자체에 집중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당시 시민의 초상권이 지금처럼 문제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진가들이 굳이 사람의 얼굴을 넣으려 하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풍경 사진 속에 사람의 얼굴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건 언제였을까요? 정확한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이미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1980년대 후반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거리 지도에 찍힌 시민 얼굴,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한국 사회는 개인정보 유출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T의 고객 정보가 해킹당했고, 롯데카드 고객 정보도 새어나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AI) 학습용 거리 지도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AI가 거리에서 사람 얼굴 좀 보면 어떠냐”며 규제 혁파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자율주행차와 로봇이 촬영한 영상에서 얼굴 등 개인 식별 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고, 원본 영상은 원칙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작년 2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 등 일부 기업에 한해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돼 원본 영상 활용이 허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도 거의 모든 얼굴이 모자이크되는 현실. 정부와 사회가 이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초상권의 대안은 무엇일까
100년 전 사진은 해상도가 낮아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었고, 사진기자들 역시 사람의 얼굴을 풍경 속에 의도적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시민의 얼굴이 실리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과도한 얼굴 노출도 문제지만, 지금처럼 무분별한 모자이크 역시 어색합니다. 지금 신문과 방송에서 얼굴이 온전히 드러나는 직업군은 정치인과 연예인뿐입니다.
100년 전 자연에 집중했던 풍경 사진을 통해, 오늘날 개인정보와 초상권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풍경 사진 속에 사람의 얼굴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처럼 모든 얼굴을 모자이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청계천 옆 사진관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횡설수설
구독
-

이기진의 만만한 과학
구독
-

기고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가을밤 물든 진관사 달오름 음악회[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9/21/132429125.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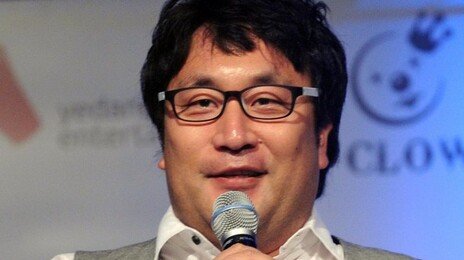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