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향기]둥글납작 얼굴에 외꺼풀… 근대 미인상은 만들어졌다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일제강점기 日 여성상 동경했지만, 반일 감정 확산하며 미의식 바뀌어
광고엔 한복 입은 조선 여인 등장… 지역-시대에 따라 미의 기준 변화
◇미인 만들기(근대 동아시아가 제조한 미인상과 미의식)/김지혜 지음/432쪽·2만8000원·서해문집


한국의 김연아와 일본의 아사다 마오의 대결을 앞두고 언론은 두 선수를 ‘세기의 라이벌’이라 부르며 요모조모 비교했다. 경기력이나 수상 경력 및 필살기는 물론이고, 키가 1cm 차이란 걸 짚은 보도도 있었다. 1990년생 동갑내기로 생일이 20일 차이라는 것조차 주목받았다.
그런데 소셜미디어 등에선 지금 생각하면 낯부끄러운 투덕거림도 적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외모를 따지는 게 옳지 않다는 인식이 부족했던 탓이었겠으나, 두 운동선수를 두고 누가 낫다는 둥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미의 기준’이란 사람마다 지역마다 시대마다 다를 수밖에 없건만, 서로가 옳다고 우기는 촌극은 꽤나 격렬했다.
“이러한 변화는 1923년 조선물산장려회의 물산 장려 운동을 계기로 가속화했다. … 조선 제품의 광고 속 여성 이미지는 일본 도상을 차용하지 않고 조선이 여성을 모델로 한 사실적인 미인상을 그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복 차림에 둥글고 납작한 얼굴과 붉게 상기된 두 볼, 외꺼풀의 눈매는 기존의 일본 미인 도안에서 볼 수 없었던 여성상으로…”(3장 미인 제조 ‘일본 미인상의 조선적 변용’에서)

저자는 여성의 신체를 키와 몸무게 등으로 수치화하는 서구적 미의 기준은 외모 지상주의와 여성의 상품화를 불러온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또 다른 맥락도 있다고 설명한다. 당시 막 여성의 사회 진출이 시작되던 초기, 미인임을 공적으로 알리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자기표현 수단이 됐다는 점에서 지금의 미인 대회와는 다른 의미를 지녔다는 분석이다.
책의 향기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서광원의 자연과 삶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의 향기/밑줄 긋기]너를 보내는 동안](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09/133126039.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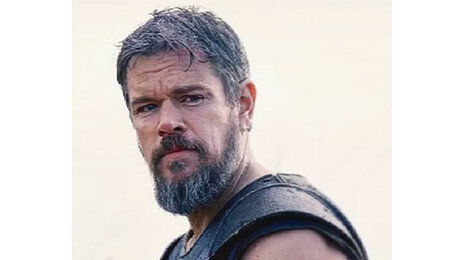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