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사설]119보다 굼뜬 광역상황실, ‘응급실 찾아주기’ 전담할 수 있나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6일 23시 24분
글자크기 설정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표류’를 막기 위해 전국 6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찾는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광주 전남 전북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소방청 산하 119구급대가 병원을 찾아 일일이 전화를 돌리고 필요한 경우 광역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하는데 앞으로는 중증 응급환자에 한해 응급의료 이해도가 높은 광역상황실로 관련 업무를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19구급대의 병원 이송을 ‘지원’하는 역할도 제대로 못 하는 광역상황실이 ‘전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19구급대가 중증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광역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한 사례는 1476건이지만 이 중 상황실이 병원을 찾아준 경우는 414건(28%)에 불과했다. 이송 병원을 찾아내는 데 걸린 시간도 평균 35분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평균 8.6분)보다 훨씬 오래 걸려 구급대원들이 웬만해서는 광역상황실로 지원 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광역상황실 업무가 더딘 이유는 이송 대상이 119에서도 적당한 병원을 찾지 못해 지원을 의뢰한 고난도 중증 응급환자들이 대부분인 탓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병원 이송 성공률이 28%로 저조한 원인은 따져봐야 한다. 중증 응급환자는 하루 평균 2000명이 넘는데 광역상황실은 의사 1명과 간호사 3∼5명이 교대로 상주할 뿐이다. 지역별로 적정 인력을 산정해 확충하는 한편 병원별 병상 가동률과 병원 이송을 기다리는 환자 상태를 수시로 갱신해 알려주는 상황판 개선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트렌드뉴스
-
1
美민주당 상원의원들, 트럼프에 ‘韓핵잠 원료 공급’ 반대 서한
-
2
“130도 안심 못 해”…30년 경력 심장 전문의 “혈압 목표 120/80”[노화설계]
-
3
비트코인 2000원씩 주려다 2000개 보냈다…빗썸 초유의 사고 ‘발칵’
-
4
[단독]국힘, ‘한동훈 제명 반대 성명’ 배현진 징계 절차 착수
-
5
국힘 떠나는 중도층… 6·3지선 여야 지지율 격차 넉달새 3 → 12%P
-
6
아르헨티나 해저 3000m에 ‘한국어 스티커’ 붙은 비디오 발견
-
7
8년째 ‘현빈-손예진 효과’ 스위스 마을…“韓드라마 덕분에 유명세”
-
8
“정청래 잘한다” 38%, “장동혁 잘한다” 27%…당 지지층서도 두자릿수 하락
-
9
통일부 이어 軍도 “DMZ 남측 철책 이남은 韓 관할” 유엔사에 요구
-
10
‘알짜 구내식당’ 오픈런… “점심 한 끼 6000원 아껴 주식 투자”
-
1
[단독]국힘, ‘한동훈 제명 반대 성명’ 배현진 징계 절차 착수
-
2
李 “서울 1평에 3억, 말이 되나…경남은 한채에 3억?”
-
3
‘YS아들’ 김현철 “국힘, 아버지 사진 당장 내려라…수구집단 변질”
-
4
장동혁 ‘협박 정치’… “직 걸어라” 비판 막고, 당협위원장엔 교체 경고
-
5
‘600원짜리 하드’ 하나가 부른 500배 합의금 요구 논란
-
6
[단독]트럼프 행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승인
-
7
[사설]반대파 무더기 퇴출 경고… 당권 장악에만 진심인 장동혁
-
8
주민센터서 공무원 뺨 때리고 박치기 한 40대 민원인
-
9
한동훈 제명, 국힘에 긍정적 18%…與-조국당 합당, 반대 44%-찬성 29%
-
10
조현 “美, 韓통상합의 이행 지연에 분위기 좋지 않다고 말해”
트렌드뉴스
-
1
美민주당 상원의원들, 트럼프에 ‘韓핵잠 원료 공급’ 반대 서한
-
2
“130도 안심 못 해”…30년 경력 심장 전문의 “혈압 목표 120/80”[노화설계]
-
3
비트코인 2000원씩 주려다 2000개 보냈다…빗썸 초유의 사고 ‘발칵’
-
4
[단독]국힘, ‘한동훈 제명 반대 성명’ 배현진 징계 절차 착수
-
5
국힘 떠나는 중도층… 6·3지선 여야 지지율 격차 넉달새 3 → 12%P
-
6
아르헨티나 해저 3000m에 ‘한국어 스티커’ 붙은 비디오 발견
-
7
8년째 ‘현빈-손예진 효과’ 스위스 마을…“韓드라마 덕분에 유명세”
-
8
“정청래 잘한다” 38%, “장동혁 잘한다” 27%…당 지지층서도 두자릿수 하락
-
9
통일부 이어 軍도 “DMZ 남측 철책 이남은 韓 관할” 유엔사에 요구
-
10
‘알짜 구내식당’ 오픈런… “점심 한 끼 6000원 아껴 주식 투자”
-
1
[단독]국힘, ‘한동훈 제명 반대 성명’ 배현진 징계 절차 착수
-
2
李 “서울 1평에 3억, 말이 되나…경남은 한채에 3억?”
-
3
‘YS아들’ 김현철 “국힘, 아버지 사진 당장 내려라…수구집단 변질”
-
4
장동혁 ‘협박 정치’… “직 걸어라” 비판 막고, 당협위원장엔 교체 경고
-
5
‘600원짜리 하드’ 하나가 부른 500배 합의금 요구 논란
-
6
[단독]트럼프 행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승인
-
7
[사설]반대파 무더기 퇴출 경고… 당권 장악에만 진심인 장동혁
-
8
주민센터서 공무원 뺨 때리고 박치기 한 40대 민원인
-
9
한동훈 제명, 국힘에 긍정적 18%…與-조국당 합당, 반대 44%-찬성 29%
-
10
조현 “美, 韓통상합의 이행 지연에 분위기 좋지 않다고 말해”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10년 만에 해외자원개발… 정권 임기 넘어선 전략 찾아야 성공](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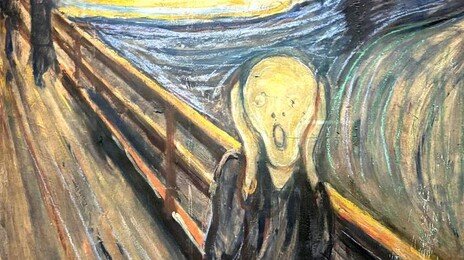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