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사랑의 모양[내가 만난 명문장/안희연]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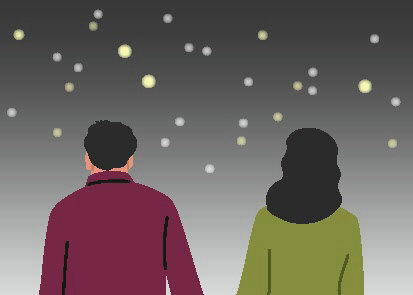
“산다는 게 참 끔찍하다. 그렇지 않니?”
―권여선 ‘봄밤’ 중

‘봄밤’의 첫 문장은 도돌이표와 같다. 아무리 부정하고 벗어나려 해도 번번이 그 앞으로 되돌아온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삶의 끔찍함과 위태로움, 비정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 안의 무언가가 달라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안으로 짓눌릴수록 더 멀리까지 튀어 오르는 용수철처럼 감정의 방향이 뒤바뀌는 순간이.
언젠가 한번은 영경을 향한 수환의 사랑을 상상하며 이런 문장을 썼다. “물을 마시지만 물을 침범하지 않는 사랑을 알고 싶었다”(시 ‘측량’). ‘그래 맞아, 산다는 건 끔찍해. 그렇더라도…’라는 마음으로 일으킨 문장이다. 사랑의 모양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로부터 사랑은 태어나고 자란다. 그 사실을 떠올리면, 잠시 발치가 환해지는 것도 같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
2
‘신세계 손녀’ 애니, 아이돌 활동 잠시 멈춘다…무슨 일?
-
3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장동혁호 ‘뺄셈 정치’ 가나
-
4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
5
트와이스 지효, 고급 시스루 장착…美 골든글로브 참석
-
6
‘뱃살 쏘옥’ 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방법?
-
7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8
반찬통 착색 고민 끝…‘두부용기’ 버리지 말고 이렇게 쓰세요 [알쓸톡]
-
9
[사설]참 구차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
10
뉴욕서 연봉 4억받던 22세 한인 사표…‘이것’ 때문이었다
-
1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장동혁호 ‘뺄셈 정치’ 가나
-
2
특검 “尹, 권력욕 위해 계엄… 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
3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4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
5
[사설]특검, 尹 사형 구형…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
-
6
[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
7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
8
중수청법 비판에 李 “내가 검찰 최고 피해자…개혁의지 의심말라”
-
9
[속보]한동훈 “윤리위 제명 결정, 또다른 계엄 선포…반드시 막을 것”
-
10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트렌드뉴스
-
1
[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
2
‘신세계 손녀’ 애니, 아이돌 활동 잠시 멈춘다…무슨 일?
-
3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장동혁호 ‘뺄셈 정치’ 가나
-
4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
5
트와이스 지효, 고급 시스루 장착…美 골든글로브 참석
-
6
‘뱃살 쏘옥’ 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방법?
-
7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8
반찬통 착색 고민 끝…‘두부용기’ 버리지 말고 이렇게 쓰세요 [알쓸톡]
-
9
[사설]참 구차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
10
뉴욕서 연봉 4억받던 22세 한인 사표…‘이것’ 때문이었다
-
1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장동혁호 ‘뺄셈 정치’ 가나
-
2
특검 “尹, 권력욕 위해 계엄… 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
3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4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
5
[사설]특검, 尹 사형 구형…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
-
6
[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
7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
8
중수청법 비판에 李 “내가 검찰 최고 피해자…개혁의지 의심말라”
-
9
[속보]한동훈 “윤리위 제명 결정, 또다른 계엄 선포…반드시 막을 것”
-
10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람 아닌 자리[내가 만난 명문장/백민석]](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7/20/132036581.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