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조용한 의자를 닮은 밤하늘[박연준의 토요일은 시가 좋아]〈4〉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가을이라서 그럴까? 나는
의자를 잊은 채
의자에 오래 앉아 있었다.
잠을 완전히 잊은 뒤에
잠에 도착한 사람 같았다.
거기는 아이가 아이를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낙엽처럼 쌓여 있는 곳
(중략)
빗방울들이 모두 달랐다.
이 비 그치고
거기 어딘가의 별들 가운데
깊은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다.
조용한 의자를 닮은
그럼 밤하늘이라고 중얼거렸다.
―이장욱(1968∼)
의자는 참 신기하다. 어느 때는 마음이 되고 어느 때는 시간 혹은 장소가 되고, 마음을 빼앗는 풍경 앞에서는 풍경 자체가 된다. 시인은 밤하늘의 자리를 짚어 “조용한 의자를 닮은” 밤하늘이라 한다. 이때 의자는 “별들 가운데 깊은 자리”, 그 여백만큼의 자리 하나가 된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나’는 잃어버린 게 많은데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아닌가? 시를 천천히 다시 읽으면 밤하늘을 닮은 의자에 앉아 의자를 닮은 밤하늘로 이송되는 기분이 든다. 하늘로 이송이라니? 시에서라면 가능하다.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것을 잊는다면, 가장 쉽고 빠른 순간이동이 의자 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그곳은 잃어버린 것들이 모여 사는 곳일지도 모른다.
박연준의 토요일은 시가 좋아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유재영의 전국깐부자랑
구독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등짐[박연준의 토요일은 시가 좋아]〈5〉](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8/29/132283653.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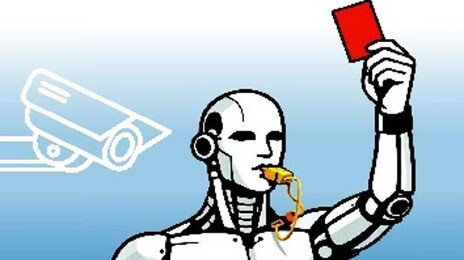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