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내가 미술관에 가는 이유[정성갑의 공간의 재발견]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큰 스크린에서는 김창열 화백의 인생이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펼쳐졌다. 머리카락이 검고 반듯하게 양복을 입은 건실한 인상의 청년은 어느새 머리카락이 세고 넘어질세라 조심조심 걷는 노인이 되어 말한다.
“대학 3년 때는 6·25전쟁이 터졌습니다. 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같이 행군하던 전우들 여럿이 한꺼번에 옆에서 폭사하는 것도 보았고, 총알이 귓가를 스치는 일은 여러 번 겪었습니다. 중학교 동창 중에 반 이상이 6·25전쟁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60년대 중반에는 주머니에 단돈 4불을 전 재산으로 가지고 뉴욕 케네디 공항에 내린 적도 있고, 70년대 초엔 프랑스 파리 근교의 마구간 화실에서 아침을 지어 먹을 쌀 한 톨 없는 신혼 생활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굽이굽이 유난히 많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은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살아온 인생이 온통 기적의 연속 같아요. 물방울을 그리는 건 모든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고통과 불안을 물로 지우는 겁니다. 내게 그림은 사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행위였습니다.”
정성갑의 공간의 재발견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딥다이브
구독
-

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구독
-

주성하의 ‘北토크’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정원에서 새로 인생 써내려간 ‘일타 강사’[정성갑의 공간의 재발견]](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9/25/132465824.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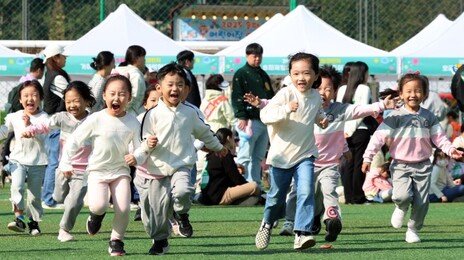
![화장실 갇혔을 때 생존법…“최후에는 변기뚜껑” [알쓸톡]](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042007.3.thumb.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