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DBR]보호무역-인구절벽-AI 혁신… ‘코리아 피크아웃’ 기로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탈세계화-구조적 불안정성에
흔들리는 韓 성장모델
AI-디지털 혁신 돌파구 삼아야

2026년은 팬데믹 이후 본격화한 탈세계화, 인구절벽과 불평등 심화로 인한 구조적 불안정성, 인공지능(AI) 혁신 본격화라는 세 가지 대전환이 동시에 맞물리는 분기점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코리아 피크아웃(Korea peakout) 우려를 현실로 만들 위기일 수도, 반대로 새로운 성장 궤도를 열어줄 기회일 수도 있다. 코리아 피크아웃은 한국 경제가 성장 고점에서 하락 국면으로 전환할 위험을 뜻하는 개념이다.
대전환의 첫 번째 축은 탈세계화다. 미중 패권 경쟁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자유무역 질서가 약화했고, 리쇼어링과 경제 블록화는 확산했다.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에 탈세계화는 성장 모델 자체를 흔드는 구조적 충격이다. 해법은 공급망 다변화, 무역 리스크 내재화, 제품-서비스 결합형 고부가 산업 전환이다.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밸류체인을 재설계하며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제품·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두 번째 축은 구조적 불안정성이다. 인구절벽과 불평등 심화는 한국 사회에 균열을 축적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7명대에 머문다. 2025년엔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매년 30만 명 이상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는 기업의 인재 전략과 성장 모델을 흔든다. 갈수록 커지는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 문제도 위험 요소다. 청년층은 주거와 고용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중장년층은 불안정한 노후와 부채에 시달린다. 정부와 기업은 산업 구조를 첨단 기술·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와 리스킬링·업스킬링을 강화해야 한다. 포용적 고용과 공정한 기회 제공으로 사회적 신뢰도 쌓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 담론의 반복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전략 설계다. 국가는 산업 포트폴리오와 인재 전략, 사회·경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기업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 AI 기반 생산성 혁신, 사회적 신뢰 자산 축적에 나서야 한다. 피크아웃의 논란을 잠재우고 새로운 성장 곡선을 그려 나가는 일은 이 전략들의 실행에 달려 있다.
DBR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비즈워치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유상건의 라커룸 안과 밖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DBR]포터블 멀티로컬리티](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9/21/13243337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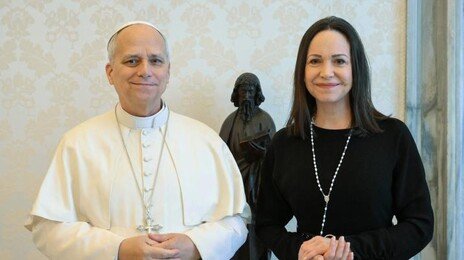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