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김재영]은행 잘못 없어도 ‘피싱’ 배상… 개인 탓만 할 수 없는 현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9일 23시 2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취임식. 첫 일정으로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순간, 박 본부장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서울중앙지검 김민석 검사입니다. 박성주 님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돼….” 실제 상황은 아니고 경찰이 제작한 홍보 영상의 일부다.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인공지능(AI) 전문가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쓰레기 무단 투기를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악성 링크를 누를 뻔한 적이 있다고 털어봤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어눌한 목소리로 실소를 자아내는 수준이 아니다. 개인정보를 탈취해 정교하게 시나리오를 짜고, AI 딥페이크 기술로 가족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복제하니 여간 주의를 기울여도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 이에 28일 정부는 은행 등 금융회사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강력한 처방을 내놨다. 금융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금융사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 달라는 주문이다.
▷금융사들이 지난해부터 자율배상이란 이름으로 피해 보상을 시작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사들이 예방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했을 때만 가능했는데 비밀번호·인증서가 위·변조된 경우, 제3자가 피해자 몰래 송금·이체한 경우 등 몇 가지로만 제한됐다. 피해자가 사기나 협박에 당했더라도 직접 송금했다면 구제받을 수 없었다. 영국은 소비자가 속아서 송금한 경우에도 최대 8만5000파운드(약 1억6000만 원)까지 은행의 피해 배상을 의무화했다. 싱가포르는 과실 정도에 따라 은행, 통신사, 소비자가 책임을 나눠 진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2006년 5월 인천에서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전화로 돈을 가로챈 사건이다. 800만 원으로 시작된 피해는 올해 상반기에만 7766억 원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정부, 금융사, 통신사 등이 공조해 예방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개인과 가정을 파탄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참 나쁜 범죄다. ‘오죽 허술하면 속느냐’는 식으로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때는 이미 지났다.
횡설수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고양이 눈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정치를 부탁해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횡설수설/장관석]그날의 한덕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8/31/132291145.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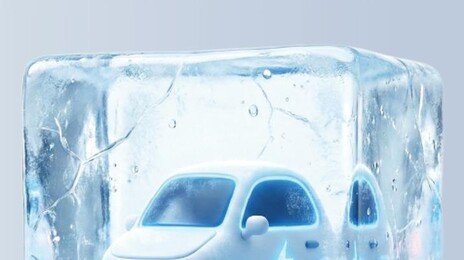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