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한미 정상회담이 남긴 세 가지 외교 성과[기고/조병제]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톈안먼 사열대의 시진핑 국가주석 곁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다. 2015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섰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출범 후 숨 가쁘게 달려온 몇 주간의 외교 일정이 3일로 일단락된다. 지난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세 가지 점에서 의미가 컸다. 첫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동안 협의를 뒷받침해 나갈 정상 간 신뢰를 구축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일각의 ‘친중 좌편향’ 인식도 해소했다. 워싱턴에 앞서 도쿄에 들른 것이 주효했다.
둘째, 오랫동안 한국 외교의 발목을 잡았던 ‘전략적 모호성’ 논란을 끝냈다. 이 대통령은 ‘안미경중(安美經中)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분법이나 흑백논리가 아니다. 애초 ‘안미경중’은 정책이라기보다 세계화와 동아시아 분업 체계의 결과물이었다. 지금 세계화는 역전되고, 한국과 중국은 시장과 가치 사슬에서 격렬하게 부딪친다. ‘중국제조 2025’의 성공으로 ‘경중(經中)’은 설 자리가 좁다.
한미 정상회담과 김정은의 방중은 한국 외교 앞의 엄중한 과제를 말한다. 먼저, 한미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체화해야 한다. 여기가 풀려야 다른 과제도 쉬워진다. 미국 제조업 재건과 한국 일자리 창출에 모두 도움이 되는 ‘윈윈 공식’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 트럼프의 협상은 거칠다. 거대 시장과 군사력을 배경으로 묻는다. “너는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느냐?” 상호 보완성과 역할 분담이 키워드다.
다음은 한중 관계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 절연할 수 없다”고 했다. 중국은 한국의 ‘균형 외교’, 즉 미중 사이에 새로운 좌표 설정을 주문한다. 과거에는 ‘구동존이(求同存異)’ 한마디로 넘어갔지만, 지금은 아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걷어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까? 전략적 자율성은 기교가 아니라, 인내와 투쟁으로 얻는 자산이다. 주한미군에 기지 소유권을 넘기고 빠져나갈 수도 없다. 전략적으로 북한을 지금 자리에 묶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 관계 설정이다. 우리에게 남북은 특수 관계지만, 북한은 “서로 모른 채 살자”고 한다. 그런데 뜯어 보면, 말이 다르지만 남북이 바라보는 방향은 같다.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극과 극을 오가는 대북정책이다. 이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정치권 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북한은 8·15 직후 이 대통령을 향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시작해 보지도 않고 할 말은 아니다. 김정은도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기고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주성하의 ‘北토크’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가족 몰래 102세 노인과 혼인신고한 간병인…수백억 재산 노렸나
-
2
野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27억” vs 與 “張대표 주택 6채”
-
3
사장은 힘들고, 손님은 서럽다…‘No Zone’ 늘어가는 요즘 카페
-
4
“빵 먹는 조선민족 만들자!” 김정은이 빠다와 치즈에 꽂힌 이유[주성하의 ‘北토크’]
-
5
美민주당 상원의원들, 트럼프에 ‘韓핵잠 원료 공급’ 반대 서한
-
6
‘미모 금메달’ 차준환…보그, 밀라노 올림픽 최고 미남 선정
-
7
불법이민단속 ICE를 왜 올림픽에 배치?…밴스 등장에 쏟아진 야유
-
8
변호사의 나라 vs 엔지니어의 나라… 서로 다른 길 걷는 초강대국 美-中
-
9
아르헨티나 해저 3000m에 ‘한국어 스티커’ 붙은 비디오 발견
-
10
“친구는 주식으로 집 샀다는데”… ‘포모 증후군’에 빠진 대한민국
-
1
국힘 떠나는 중도층… 6·3지선 여야 지지율 격차 넉달새 3 → 12%P
-
2
요즘 화제는 ‘@Jaemyung_Lee’, 밤낮 없는 李대통령 SNS 정치
-
3
野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27억” vs 與 “張대표 주택 6채”
-
4
국힘, 새 당명 3월 1일 전후 발표…“장동혁 재신임 문제 종결”
-
5
한동훈의 선택은? 4가지 시나리오 집중 분석해보니 [정치TMI]
-
6
美민주당 상원의원들, 트럼프에 ‘韓핵잠 원료 공급’ 반대 서한
-
7
국힘 집안싸움 격화… 윤리위, 배현진 징계절차 착수
-
8
조국 “대선 득표율差 겨우 0.91%인데…합당 반대자들 죽일 듯 달려들어”
-
9
‘알짜 구내식당’ 오픈런… “점심 한 끼 6000원 아껴 주식 투자”
-
10
‘똘똘한 한 채’ 열풍…자가 비율 1위 싱가포르도 못 막았다[딥다이브]
트렌드뉴스
-
1
가족 몰래 102세 노인과 혼인신고한 간병인…수백억 재산 노렸나
-
2
野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27억” vs 與 “張대표 주택 6채”
-
3
사장은 힘들고, 손님은 서럽다…‘No Zone’ 늘어가는 요즘 카페
-
4
“빵 먹는 조선민족 만들자!” 김정은이 빠다와 치즈에 꽂힌 이유[주성하의 ‘北토크’]
-
5
美민주당 상원의원들, 트럼프에 ‘韓핵잠 원료 공급’ 반대 서한
-
6
‘미모 금메달’ 차준환…보그, 밀라노 올림픽 최고 미남 선정
-
7
불법이민단속 ICE를 왜 올림픽에 배치?…밴스 등장에 쏟아진 야유
-
8
변호사의 나라 vs 엔지니어의 나라… 서로 다른 길 걷는 초강대국 美-中
-
9
아르헨티나 해저 3000m에 ‘한국어 스티커’ 붙은 비디오 발견
-
10
“친구는 주식으로 집 샀다는데”… ‘포모 증후군’에 빠진 대한민국
-
1
국힘 떠나는 중도층… 6·3지선 여야 지지율 격차 넉달새 3 → 12%P
-
2
요즘 화제는 ‘@Jaemyung_Lee’, 밤낮 없는 李대통령 SNS 정치
-
3
野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27억” vs 與 “張대표 주택 6채”
-
4
국힘, 새 당명 3월 1일 전후 발표…“장동혁 재신임 문제 종결”
-
5
한동훈의 선택은? 4가지 시나리오 집중 분석해보니 [정치TMI]
-
6
美민주당 상원의원들, 트럼프에 ‘韓핵잠 원료 공급’ 반대 서한
-
7
국힘 집안싸움 격화… 윤리위, 배현진 징계절차 착수
-
8
조국 “대선 득표율差 겨우 0.91%인데…합당 반대자들 죽일 듯 달려들어”
-
9
‘알짜 구내식당’ 오픈런… “점심 한 끼 6000원 아껴 주식 투자”
-
10
‘똘똘한 한 채’ 열풍…자가 비율 1위 싱가포르도 못 막았다[딥다이브]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높이는 ‘관세 행정 개선’[기고/이명구]](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9/02/13230748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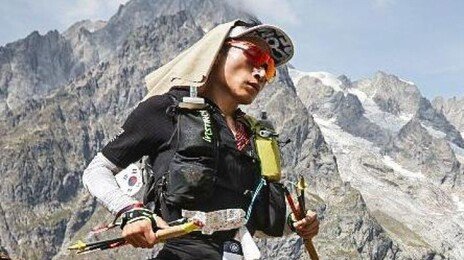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