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이미지]탑골공원 바둑판 철거로 본 韓 고령사회의 민낯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31일 23시 1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전 세계 수억 명이 시청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에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이 등장한다. 게임 호객꾼 ‘딱지맨’이 공원에서 어르신과 노숙인들을 상대로 참가자를 모집하는 장면이다.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탑골공원은 이처럼 갈 곳 없는 어르신과 노숙인들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 묘사돼 왔다. 언론 보도에서는 ‘어르신 놀이터’ ‘노숙인 성지’ 같은 표현도 흔히 쓰인다.
최근 종로구가 이런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며 공원 담장 옆 바둑·장기판을 철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어르신들이 모여 게임을 하다 말다툼과 몸싸움이 잦았고, 노상방뇨 같은 불쾌한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다른 시민들의 이용이 어렵다는 게 구청 측이 설명한 철거 이유다. 하지만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환경을 개선하면 될 일을 굳이 어르신들의 놀이 공간 철거로 해결하려 했느냐는 반론도 뒤따랐다. 노인 혐오와 낙인을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구청의 고충도 이해할 만하다. 탑골공원에서는 노인·노숙인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상인들은 “상권이 죽는다”는 불만을 거듭 제기해왔다. 1897년 조성된 국내 최초의 근대식 공원인 탑골공원은 사적 제354호로 지정된 국가문화유산이다. 3·1운동의 발상지로 매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이 역사적 공간이 노인·노숙인 집결지라는 부정적 이미지에 가려지는 상황을 행정 당국이 마냥 방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공적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도 20% 남짓에 불과하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지만,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줄곧 최상위권에 머물러 있다. 노년기를 전기(65∼74세)와 후기(75세 이상)로 나눠 보면, 후기로 갈수록 빈곤은 더 심각하다. 근로소득이 줄고 건강까지 악화되면서 7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50%를 넘어선다. 탑골공원을 찾는 노인의 상당수가 바로 이런 노인들이다. 고령화로 가난한 노인들이 늘면 사회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노인의 수는 2025년 약 27명에서 2050년 74명, 2070년에는 81명에 이를 전망이다. 탑골공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틀딱충’ 같은 노인 혐오 표현은 이런 현실에서 오는 젊은 세대의 부담과 무관하지 않다.
탑골공원 장기판 철거 논란은 결국 근본적 보장과 제도가 부족한 현실에서 생겨난 약자들의 집결, 그리고 그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2070년이면 우리 인구의 절반 가까운 46%가 65세 이상이 된다. 고령사회의 거대한 다수가 될 노인의 경제사회적 역할을 확충해 새로운 ‘착점(着點)’을 만들어 주지 못한다면, 오늘의 탑골공원 갈등은 내일 또 다른 공간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광화문에서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구독
-

DBR
구독
-

내가 만난 명문장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이유종]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 값싼 인력 아닌 성장 파트너로](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9/01/132299217.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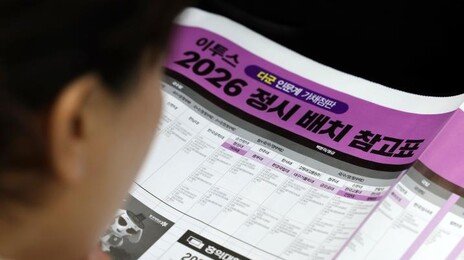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