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꽃을 향한 집착[이준식의 한시 한 수]〈335〉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봄바람 살랑살랑, 화사한 빛 속에 활짝 꽃 피었다가
꽃향기 서린 안개가 자욱이 번지고, 달빛은 회랑 저편으로 돌아간다.
밤 깊어 꽃이 잠들어 버릴까 걱정되는 마음,
(東風裊裊泛崇光, 香霧空蒙月轉廊. 只恐夜深花睡去, 故燒高燭照紅粧.)―‘해당화(해당·海棠)’ 소식(蘇軾·1037∼1101)
아름다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누구나 품어봤을 법한 감정이 시 속에 고스란히 담겼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화사하게 꽃이 피어났는데, 어느새 안개가 몰려오고 어둠이 찾아온다. 달빛이 시나브로 옅어지면서 해당화의 화려한 자태가 사라져 버릴까 맘 졸인다. 급기야 시인은 촛불을 든다. 촛불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다. 꽃에게 건네는 손길이자, 고독한 자신을 달래는 몸짓이다. 시인은 이 시를 쓸 당시 유배지에서 고된 삶을 보내던 중이었다. 호방하고 초연한 마음을 담은 시문을 즐겨 지었지만, 마음속에는 이렇게라도 붙잡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던 셈이다. 꽃이 잠드는 것을 염려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고적(孤寂)을 달래기 위한 안감힘이었을 수도 있겠다.
정치적 굴곡과 유배의 고통 속에서도 소동파는 언제나 소탈하고 낙관적인 품성을 잃지 않았다. 그런 그가 이 시에서 뜻밖에도 ‘한사코 붙들려는 마음’을 토로한다. 이런 집착은 낯설지만 그래서 더 인간적이기도 하다. 소멸을 막을 수는 없지만 사라지기 전의 찬란함을 지켜내려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 속에서 붙들어야 할 마지막 불빛인지도 모른다.
이준식의 한시 한 수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히어로콘텐츠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염복규의 경성, 서울의 기원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고요 속의 성찰[이준식의 한시 한 수]〈336〉](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10/03/13251542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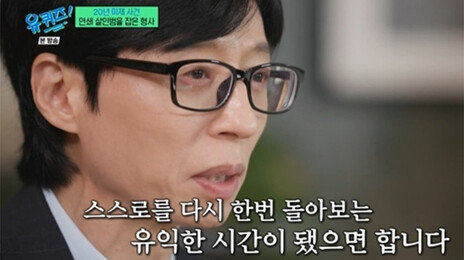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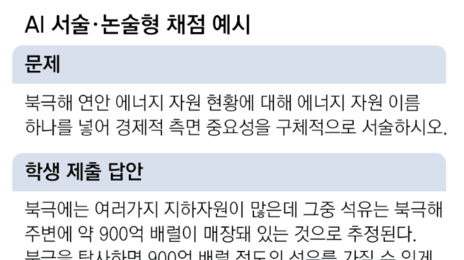
댓글 0